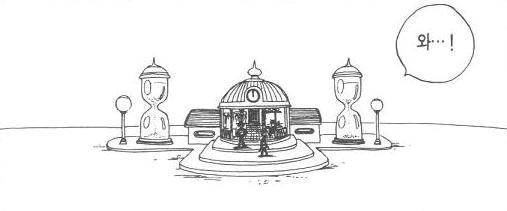지난회 이야기. 깨져도 단단히 깨졌다. 좋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다. 정신차리고, 나에 대해 알아야 했다. 그래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테니.
크레바스Crevasse. 단단한 빙산에서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지형이다. 빙하가 이동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높이만 하더라더 최소 10m 이상으로 막상 찾으려고 해도 눈에 의해서 윗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딛으면 그대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요즘 이 바닥에서는 버티컬이란 말이 유행이다. 특정분야의 정보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대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리소스로 특정분야를 빠르게 공략하는 전략을 뜻하기도 한다. 어쨋건 나도 밟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버티컬플랫폼, 크레바스를 찾아야 했다.
Scene11. 첫번째 빙산.
유닛의 첫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B2B였다. 모든 인트라넷의 직원들의 연락처와 고객관리 CRM까지 연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직원들이 연락하고, 수집한 거래처 등을 메인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하겠다는 포부였다. 실제로 일본에는 직원들이 수집한 명함들도 회사의 자산이라 하여 사내 명함을 특별히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 시작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을 떠나서 우리 팀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개발이 메인인 팀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건, 솔루션으로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고, 서버팀이 강력한 팀이어야 가능했다. 한참을 비즈니스 스터디를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정리하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세운다음에야 버렸다. 정성껏 실컷 껍질을 깠는데 먹지 못할 감이라는걸 알았을 때 입맛이 어찌나 떫던지.
Scene12. 두번째 빙산.
앱은 하지않기로 하지 않았던가. ‘앱이네?’ 수준의 ‘연락처 관리의 고급화’ 전략으로는 시장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닛의 컨셉은 ‘고객관리서비스 개인화’를 타겟시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나갔다. 그러다보니 ‘영업’ ‘비즈니스맨’의 영역에만 한정되었고, 연락처보다는 크겠지만 확실한 기업고객이 있는 CRM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작았다. 어쨋든 협업툴, 고객관리 솔루션, CRM 등을 깍아나가며 연락처가 있는 부분들만 도려냈다. Salesforce, Highrise 등 협업과 고객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잘 사용하는 해외의 서비스들을 보며 ‘연락처관리’의 빈약함을 제공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B2C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CRM 개념이 낯설다는 것이었다. B2C라고 하기엔 B2B의 성격이 강한 솔루션이랄까. 이래저래 키워드와 캐치프라이즈를 바꿔가며 설명했으나 번번히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실패를 거듭했다. 일반인에겐 필요없는 서비스지만, 일반인이 알아들을 만큼 쉬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설득의 작업은 인내보단 고통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PC의 CRM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바일CRM’이라는 말을 듣기만해도 격해졌고(;;)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내놓는데 열을 올렸다. 들으면 들을 수록 미안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다.
Scene13. 세번째 빙산…
모바일CRM이라고 할 때에도, 그냥 연락처 앱이라고 할 때에도, 모두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솔루션일 때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보면,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고, 계속해서 멘토링을 서비스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면 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느껴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멘토링을 많이 받게 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창업자도 하나고, 개발자도 하난데, 사공이 너무 많다. 멘토들의 멘토링도 영향이 크지만, 일반 사용자들로 만나는 사람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산성은 개인의 업무 프로세스라던지 생활방식에 따라 생산력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 100명이면 100개의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사용해서 모두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비전을 가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되지 않는 것인가. 답답하지만, 사업을 진행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배고프다는 이유로 먹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출처: http://goo.gl/RfcESx
Scene14. 크레바스
내 멘토는 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있는 ‘멘토’라는 사람들은 나의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없었다. 그냥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질 않고, 잘 알지 않으니 다른 지도를 주는 것이다. 정글탐험가에게 북극의 빙산을 가이드 하라고 할 순 없다. 셰르파와 같은 현지 가이드가 필요했다. 어찌됐건 비즈니스 모델보다 개발이 더 우선이었다. 기능은 정해져있으니. 그러다 일이 손에 안잡힐 땐 비즈니스 디벨로핑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통합’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다 통합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본 것이다. Collaboration 까지 합해 UC&C 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시장. 업무 프로세스에서 낭비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화-문자-메일-팩스 등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협업까지 아우르는 생산성 서비스. 기존의 PC환경에서 Cisco, MS 등 거대 기업들이 진출해있던 진짜 엔터프라이즈 시장이었다. ‘크레바스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제까지 스타트업들, 중소 벤처들을 위주로만 검색해와서 그런지 볼 수 없었던 시장이었다. 솔직히 이런 시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 (지난 4개월 간 수없이 다른 분야에서 삽질했던 건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는게 어디야..?) 그 기업들은 초대기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모바일화에 적응하기 위해 빠르게 모바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디바이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트렌드도 성장하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제2의 엔터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10%가 넘었고, 2017년에는 국내 시장만 5000억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매년 굵직하게 연구되고 보고되고 있었다. 우리가 시장점유율 1%만 차지해도 연매출 50억짜리란 얘기다. 그나저나, UC? 낯선 단어에서 익숙한 냄새가 난다. 한 때 전국민 메신저라 불렸던. 바로 네이트온. 네이트온 UC의 UC였다.
글 : 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