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스퀘어 독자여러분!
미국회사 캠블리(Cambly)의 이희승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이모저모를 다루기 전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적는 것이 제 관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프롤로그로 제가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된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국사람이며, 또한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학교는 페루에서, 고등학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간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미술, 수학, 물리를 좋아해서 건축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하였고, 뒤늦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기회 (Serendipity Finds You)
저는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직접 하고 있으리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 했습니다.
2013년 9월 휴학하고 한국에서 지내던 중, 보스턴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가 서울에 들어와 스타트업들을 미국 동부로 견학보내는 정부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흔쾌히 돕겠다고 한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 발표자료(PPT) 잠깐 봐주면 되겠지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좋은 의미로 돕는 거 이왕이면 가시적인 성과도 얻어가고 싶어서 한 팀을 임의적으로 골라 미국의 액셀러레이터에 합격을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미 전공과 다른 업계로 진로를 바꾸면서 여러 꼼수를 써보았으므로, 이 정도 원서쯤이야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손발이 다 오그라듭니다만… 저보다 훨씬 연륜있는 팀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두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북산고에 이한나가 있으면 여러분께는 제가 있습니다! 합격할 정도가 아니면 집에 안 가는겁니다!”를 외쳤습니다. 다행히 제 무식했던 패기를 좋게 봐주셔서 원서 마감날까지 즐겁게 매일 새벽까지 원서 작성에 임하였고 지원했던 테크스타 보스턴(Tech Stars Boston)과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 두 군데 모두 인터뷰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의 인터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YC가 과거에 투자한 회사들 프로필부터 파트너들의 성향까지 샅샅히 뒷조사를 하던 중, 지메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Paul Buchheit의 에세이 ‘Serendipity Finds You’를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컨설팅 혹은 대기업같은 안전한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직장을 찾아야하나 생각 중이었고, 스타트업은 계획에 없던 모험같이만 느껴졌죠. 내 30대를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던 제게 폴아저씨의 에세이는 신의 계시같았죠. 비록 인터뷰 결과는 좋지 못 했지만, 제 인생의 결정을 이 때 실리콘밸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Plans are worthless. Planning is essential.” – Dwight D. Eisenhower
스타트업이 좋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1) ‘내 성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점’, 2) ‘작지만 똑똑한 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개발자도 아니고, 경쟁 우위가 있는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같다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 스텝은 스타트업 미디어 비석세스의 비론치( beLaunch) 행사 준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보였고, 컨퍼런스 주최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기에 좋은 기회인데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구요. 예상대로 세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한테 ‘초대는 고맙지만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개인적으로 답장도 받고,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한테 ‘아시아 테크에 대한 글을 기고하는데 관심있냐’는 제안도 받는 엄청 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상당히 멋진 연사 라인업도 구성할 수 있었구요.
행사가 구체화될 수록 강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자금도, 네트워크도 아닌, 영어가 아닐까? 가끔 영어로 설명했을 때는 별로였는데 한국말로 다시 설명해주니 정말 괜찮은 제품을 봤을 때나, 한국식 미사여구를 피치덱(pitch deck)에 영어로 직역해놓은 것을 보면 아쉬울 따름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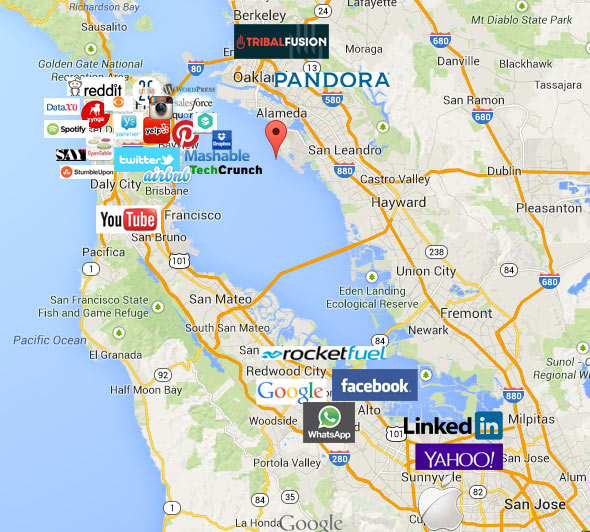
“You gain strength, courage, and confidence by every experience in which you really stop to look fear in the face. You must do the thing which you think you cannot do.”–Eleanor Roosevelt
행사 마무리와 거의 동시에 영어라는 아이템으로 개발자없이 페이스북에서 비지니스 모델 테스팅을 시작으로 현재 캠블리와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2014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는데 캠블리(Cambly) 파운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Kevin과 Sameer도 한국에 관심은 있으나 한국인이 없으면 뚫기 힘든 마켓이라고 생각해서 보류하고 있었고, 저도 개발자를 찾고 있었기에 손을 잡게 되었죠. (팀빌딩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터뷰를 봤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둘 다 있었고 Cambly는 YC 2014 겨울 프로그램을 수료한 상태였구요.
굳이 따지자면 YC 시절을 같이 보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아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전수받은 (?) 노하우들을 이행하는 최전선에 제가 서있으니까요. 그리고 YC 파트너들이나 유명한 파운더들이 술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나 인터뷰들이 저의 연재를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수백번 거절을 당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모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비슷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에 그들의 비슷하고도 다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사가 조금 길었나요? 문화 충격은 이제 일상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다 생각했지만, 지난 2년동안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계를 오가면서 어쩌면 유학 시절보다 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글로벌 시장을 노려라… 어쩌면 너무 많이 거론되서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키워드 ‘세계속의 한국’. 한국인이 아닌 반외국인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 이야기가 아닌, 흥미진진한 실리콘 밸리의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블리 아시아 총괄 이희승 bell@cambly.com

